 편집국
편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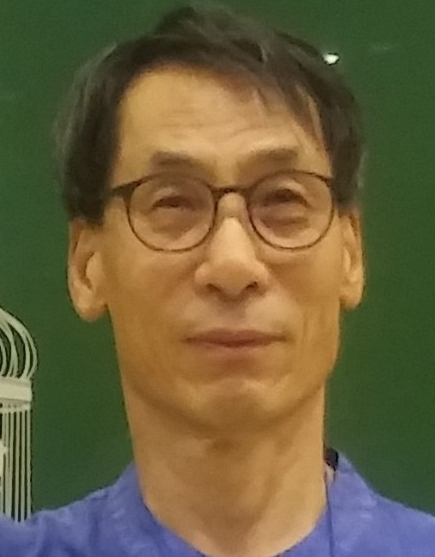
전 국방일보 편집인
"니는 내 부하다."
"내가 니 부하냐?"
요즘 난데없는 '부하' 논쟁이 한창이다. 부하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조직에서 계급이나 직책상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일본어로는 "꼬붕"이라고 되어 있다.
전역 후 국방일보 편집인으로 근무할 때 일이다. 국방부 장관이 새로 부임했다. 마침 홍보원장이 부재중이어서 간부들과의 초임 인사 자리에 대신 참석하게 되었다. 신임 장관은 현역시절 내가 참모장으로 모신 바 있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부하의 개념으로 보면 나는 진짜 직속 부하였던 셈이다. 공식 인사를 마치고 나를 알아 본 장관이 별도로 소개했다. "국방일보 이정호 부장은 옛날 저의 전우입니다."
전우라고? 마땅히 "저의 옛날 부하입니다." 를 예상했던 나에게 "전우" 라는 호칭은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전우", 전장(戰場)에서 생사를 같이했던 동료가 바로 전우 아니던가?
군에서 생사를 같이했던 전우로서의 장관과 상명하복(上命下服)으로 상징되는 부하로서의 장관은 같을 수가 없다. 두 사람 간의 인간적 관계에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전우'라는 한 마디 단어는 장관과 나와의 관계를 공식적, 형식적인 관계에서 피를 함께 나눈 영원한 동료의 관계로 바꾸어 놓았다.
되돌아 보면, 전우라는 표현은 초대 주월(駐越) 한국군 사령관을 지낸 채명신(蔡命新, 1926. 11~2013. 11)장군의 말씀으로 큰 감동을 준 바 있다. 장군은 임종을 앞두고 동작동 국립 현충원 장군묘역을 마다하고 "나의 전우들이 누워 있는 사병 묘역에 함께 눕고 싶다"고 하셨다. 그분은 지금 월남전에서 함께 싸우다 전사한 전우들 곁에 누워 계신다.
"니는 내 부하다". "내가 니 부하냐?" 참으로 듣기 민망하다. 얼굴이 뜨거워진다. 한 사람은 내 부하라 하고 한 사람은 니 부하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상관과 부하의 끈끈한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
생사를 같이하는 전우의 관계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소통과 기능발휘가 가능한 조직운영이 가능할까? 이런 조직은 한 마디로 나쁜 조직의 상징이다.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조직의 표본이다.
통상, 군에서 지휘관 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말한다. "그 사람은 내 부하였어."
"그 사람은 내 밑에 있었어." "그 사람은 내가 데리고 있었어." 이런 표현은 국민들의 선진화된 의식수준에 부합하지 못한다. 시대착오적인 사고, 자기과시적 표현이라 할 수밖에 없다.
군인들은 임무수행을 위해 직책상, 계급상의 구분이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생과 사가 엇갈리는 전투현장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인 것이다. 니가 있었기에 내가 살아 남았고, 내가 있었기에 니가 살아남는 전우라는 것이다.
코로나이후의 시대, 4차산업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0년,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아날로그 시대에 상명하복으로 상징되는 수직적 리더십으로는 안된다. 디지털 시대에 상하좌우 원활한 소통으로 대변되는 수평적 리더십도 뛰어 넘어야 한다.
지금 이 시대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지원하고 보살피는 서번트 리더십( servant leadership)으로까지 진보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진보와 보수는 한 배를 탄 전우다. 여의도의 여당과 야당은 생사를 함께 하는 전우다. 정부조직, 기업조직을 막론하고 그 구성원은 운명공동체 전우다.
21세기가 벌써 20년이 지났다. 국민들의 생존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혼돈의 시대에, 국가의 미래 자산인 청년들이 취업포기,결혼포기, 출산포기로 희망을 잃은 국난의 시대에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국도 없는 무한경쟁의 안보위기 시대에 소모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부하논쟁은 참으로 보고 듣기 민망하다.